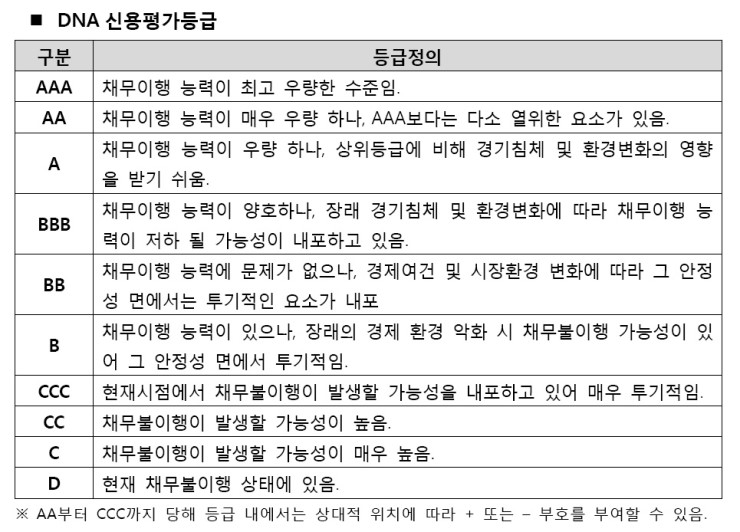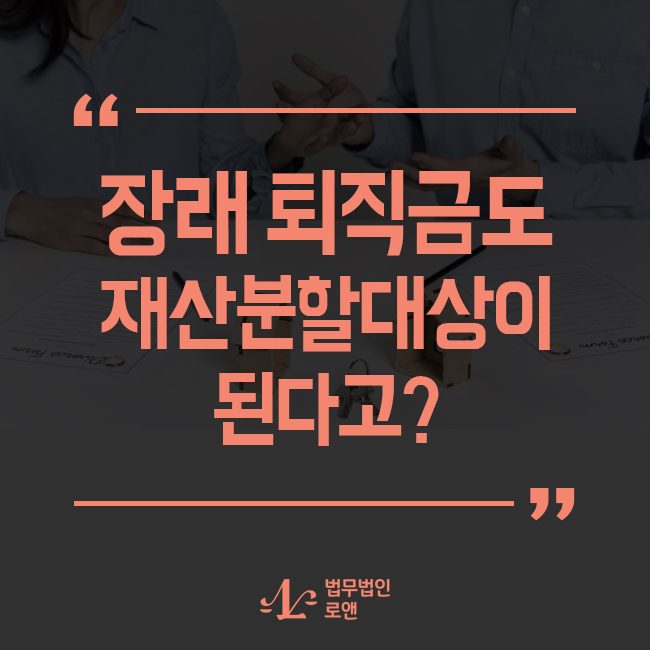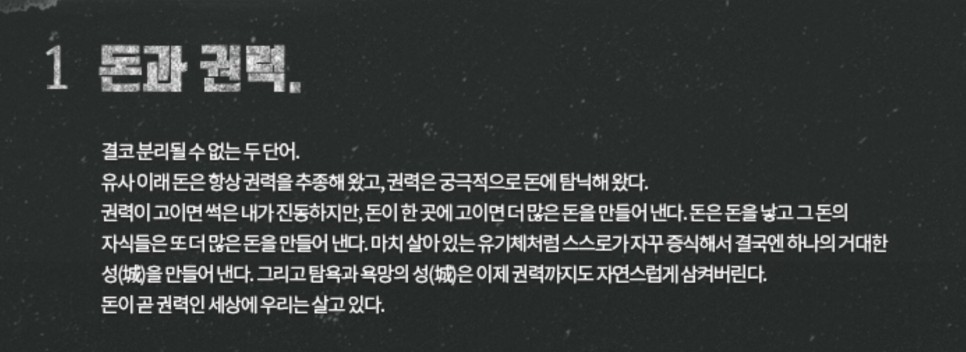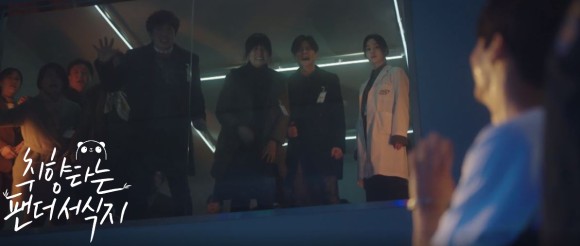한국의 모든 직업군을 망라한 직업도감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프로파일러는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강력 사건에 휘말려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고,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범인의 성격을 유추해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범죄 현장에 파견돼 범행 준비부터 범행 방법, 시신 처리까지 범행 과정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하고 동기와 용의자를 분석한다. 또한 수집된 자료와 수집된 증거물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성격 및 행동유형을 분석하고 도주경로나 은신처를 추정하여 수사관에게 제공하고 피의자 검거 후 심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여성 범죄를 밝히기 위해 탐색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범행 동기나 장소, 범행 방법, 범인의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맡는다. 범죄자는 사건을 촉발한다. 끔찍한 범죄 현장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프로파일러는 1991년 조디 포스터와 안소니 홉킨스 주연의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스털링(조디 포스터)은 연쇄살인범 한니발 렉터(앤서니 홉킨스)를 쫓고 그를 잡기 위해 심층 심리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8년 뒤인 1999년 국내 최초의 프로파일러가 탄생했다. 강호순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인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로파일러 열풍이 불었다. 그들은 그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습관,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해자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용의자의 성격 특성, 나이 및 외모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수사는 주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서 시작됐다. 피해자와 주변 인물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파악한 뒤 범행 동기가 가장 유력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진행하는데 현대에 와서 범행 동기는 모호하다.모호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이러한 수사기법에 한계를 뛰어넘어 ‘사건’이 아닌 ‘범죄자’를 기소하기 시작했다. 숫자사기성 기관은 조사가 시작되고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사건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합니다. 미해결 미스터리 사건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리학은 이 탐구의 기초입니다. “범죄자”는 그들만의 독특한 병리학적 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살인자로 변할 수 있는 병적 심리를 가진 악마들이 우리 안에 숨어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프로파일러의 임무는 불특정 다수 중에서 그러한 살인자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백하고 그들은 범죄자라는 이분법적 이론은 인종차별적,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사회적 모순과 비정상적인 상황이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범죄자로 몰아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살인에 대해 묻지 마십시오”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범죄가 아닌 범죄자의 심리를 추적하는 프로파일러의 세계는 편견과 차별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이상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찰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최근 관심을 반영하듯 프로파일러의 세계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더 보이스, 리더스 오브 이블 마인드, 시그널,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 영화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